小白山 山行記
慶尙道라는 地名이 엄연히 있는데도
또다시 嶺南地方이라는 새로운 地名을 만든 白頭大幹 중에 하나의 山인
『小白山』을 찾아서 화창한 5월의 첫주에 "휘산회"와 함께 길을 나섯습니다
 [치악휴게소]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중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를 따라
"북단양 I.C."까지 가는 길에 있는 '치악휴게소'에서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5월초 황금연휴 기간 가운데 5월3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치악휴게소]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중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를 따라
"북단양 I.C."까지 가는 길에 있는 '치악휴게소'에서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5월초 황금연휴 기간 가운데 5월3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새밭계곡 河日川]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새밭계곡"에 흐르는 물은
小白山의 '國亡峯'에서 발원하여 내려오는데 " 河日川"이라고 한답니다
이 河日川의 맑은 물은 南漢江으로 흘러 강화도 앞 西海로 멀고 먼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새밭계곡 河日川]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새밭계곡"에 흐르는 물은
小白山의 '國亡峯'에서 발원하여 내려오는데 " 河日川"이라고 한답니다
이 河日川의 맑은 물은 南漢江으로 흘러 강화도 앞 西海로 멀고 먼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준비운동]
"어의곡리"를 산행들머리로 小白山을 등산하는 산객들은 많지 않은듯합니다
오늘은 참가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 "徽山會" 교우들은 1,439m 높이의 "小白山비로봉"을 오르기 위해
산행들머리인 "어의곡리" 주차장에서 준비운동을 합니다
[준비운동]
"어의곡리"를 산행들머리로 小白山을 등산하는 산객들은 많지 않은듯합니다
오늘은 참가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 "徽山會" 교우들은 1,439m 높이의 "小白山비로봉"을 오르기 위해
산행들머리인 "어의곡리" 주차장에서 준비운동을 합니다
 [소백산 등산로 입구]
"어의곡리 소백산 산행 들머리"는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나 있습니다
비로봉 5.1km라는 팻말이 벌써부터 압박감으로 다가 옵니다
10시 45분경에 출발합니다
"소백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20개의 국립공원중에 1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백산 등산로 입구]
"어의곡리 소백산 산행 들머리"는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나 있습니다
비로봉 5.1km라는 팻말이 벌써부터 압박감으로 다가 옵니다
10시 45분경에 출발합니다
"소백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20개의 국립공원중에 1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등산로]
小白山 山行은 "죽령"이나 "희방사"에서 주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색다른 小白山의 맛을 느끼기 위해 이 코스를 선택했나 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많은 산을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시시한 등산코스는 처음입니다.
小白山은 완전한 肉山으로 볼거리가 거의 없는데다, 계곡을 오르니 시야까지 꽉막혀
외부를 조망할수도 없으니 뒷동산을 오르는 것과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정상부를 제외하고는 정말 눈에 뵈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행기는 산행기가 아니라 이런 저런 얘기로 채워야 할것같습니다
[등산로]
小白山 山行은 "죽령"이나 "희방사"에서 주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색다른 小白山의 맛을 느끼기 위해 이 코스를 선택했나 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많은 산을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시시한 등산코스는 처음입니다.
小白山은 완전한 肉山으로 볼거리가 거의 없는데다, 계곡을 오르니 시야까지 꽉막혀
외부를 조망할수도 없으니 뒷동산을 오르는 것과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정상부를 제외하고는 정말 눈에 뵈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행기는 산행기가 아니라 이런 저런 얘기로 채워야 할것같습니다
 [어의곡 마을]
등로를 조금 올라 "어의곡 마을"을 뒤돌아 봤습니다.
"어의곡 산행 들머리"에는 조그만 주차장과 가옥 몇채가 있을 뿐인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어의곡"이란 말의 유래는 두 골짜기가 어우러져 있어 엉이실, 응실 또는 어의곡(於儀谷)이라
했다고하는군요.
그리고 소백산 비로봉으로 오르는 마지막 마을이라 비로봉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어의곡 마을]
등로를 조금 올라 "어의곡 마을"을 뒤돌아 봤습니다.
"어의곡 산행 들머리"에는 조그만 주차장과 가옥 몇채가 있을 뿐인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어의곡"이란 말의 유래는 두 골짜기가 어우러져 있어 엉이실, 응실 또는 어의곡(於儀谷)이라
했다고하는군요.
그리고 소백산 비로봉으로 오르는 마지막 마을이라 비로봉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등로]
'어의곡리'에서 오르는 등산로는 비교적 넓게 잘 정비되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경상북도 영주시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이곳 단양과 풍기에서 군수를 지내신 퇴계 이황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아
퇴계 이황선생님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등로]
'어의곡리'에서 오르는 등산로는 비교적 넓게 잘 정비되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경상북도 영주시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이곳 단양과 풍기에서 군수를 지내신 퇴계 이황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아
퇴계 이황선생님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백산 어의곡 탐방 지원소]
퇴계선생님은 "등산"을 매우 좋아 하셨고, 많은 山行記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퇴계선생님이 남기신 유명한 산행에 대한 名言이 있지요?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쓴 登山과 遊山이라는 글을 다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소백산 어의곡 탐방 지원소]
퇴계선생님은 "등산"을 매우 좋아 하셨고, 많은 山行記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퇴계선생님이 남기신 유명한 산행에 대한 名言이 있지요?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쓴 登山과 遊山이라는 글을 다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산행 안내도]
[산행 안내도]
  [등로]
우리나라 역사속 인물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중에서도 저는 퇴계 이황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을 갖추신 분이시지만
제가 특히 좋아하는 연유는 선생께서 "등산"을 매우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퇴계선생님에 대해선 아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실것같아 이런 글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한때 퇴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의 향기를 느끼러 이곳 저곳 많이 다니다
나름대로는 매우 인상 깊었던 그 분의 새로운 면모를 깊이 느꼈기에 몇자 적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냘픈 몸매에 허약했던 선생은 집안 살림살이까지 어려워
영양상태가 매우 안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독학에 열중하여 더욱 허약해졌는데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일찍이 모든 과거시험에 장원급제를 하지요?
[등로]
우리나라 역사속 인물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중에서도 저는 퇴계 이황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을 갖추신 분이시지만
제가 특히 좋아하는 연유는 선생께서 "등산"을 매우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퇴계선생님에 대해선 아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실것같아 이런 글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한때 퇴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의 향기를 느끼러 이곳 저곳 많이 다니다
나름대로는 매우 인상 깊었던 그 분의 새로운 면모를 깊이 느꼈기에 몇자 적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냘픈 몸매에 허약했던 선생은 집안 살림살이까지 어려워
영양상태가 매우 안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독학에 열중하여 더욱 허약해졌는데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일찍이 모든 과거시험에 장원급제를 하지요?
 우리나라 역사 속 인물 중에 높은 관직을 고사하시고 사표를 가장 많이 제출하신 분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이시랍니다. 총 오십여회라나...칠십회라나ㅎㅎ
王들이 제발 관직을 맡아 달라고 애원을 하였으니 선생님의 위상을 짐작 하실만 하지요?
영의정등 높은 관직을 사양하신 이유 중에는 치졸한 당파싸움하는 꼴을 직접 대하기도 싫었겠지만
핑개인지는 모르지만 건강이 시원치않아 사양한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나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무지하게 챙기셨는데 주로 안동과 봉화사이의
청량산을 비롯해 소백산, 태백산, 월악산, 주흘산등, 많은 산에 등산을 함으로서 건강을 챙기시고
특히 청량산엔 "청량정사"에 기거하시며 많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뭇 강호의 유생들은 퇴계선생님을 만나려면 청량산이나 소백산을 올라야 했으니
등산 못하는 강호의 유생들은 퇴계선생님을 만나 뵙기도 힘들었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 인물 중에 높은 관직을 고사하시고 사표를 가장 많이 제출하신 분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이시랍니다. 총 오십여회라나...칠십회라나ㅎㅎ
王들이 제발 관직을 맡아 달라고 애원을 하였으니 선생님의 위상을 짐작 하실만 하지요?
영의정등 높은 관직을 사양하신 이유 중에는 치졸한 당파싸움하는 꼴을 직접 대하기도 싫었겠지만
핑개인지는 모르지만 건강이 시원치않아 사양한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나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무지하게 챙기셨는데 주로 안동과 봉화사이의
청량산을 비롯해 소백산, 태백산, 월악산, 주흘산등, 많은 산에 등산을 함으로서 건강을 챙기시고
특히 청량산엔 "청량정사"에 기거하시며 많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뭇 강호의 유생들은 퇴계선생님을 만나려면 청량산이나 소백산을 올라야 했으니
등산 못하는 강호의 유생들은 퇴계선생님을 만나 뵙기도 힘들었답니다
 퇴계선생님의 등산에 관한 유명한 명언이 있죠?
"讀書는 유산(遊山)이다"
퇴계선생님은 산을 오른다는 표현인 '登山'이라 하지 않고 "유산(遊山)"이라 하였습니다.
즉, 登山은 산을 오른다는 의미 밖에 없지요?
힘들게 산을 오르는것만이 아니라 산을 오르면 내려 가기도 해야하고,
또한 산행 도중 식사도 하고 계곡에 발도 담그며 경치를 즐겁게 즐기며 산행도 해야겠죠?
퇴계선생님은 이미 산행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고
登山이라 하지 않고 유산(遊山)이라 했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앞으로 登山이라 하지 마시고 遊山이라고 하실거죠?
讀書에 대해선 더 설명할 필요 없겠지요?
"책 속에 삶의 지혜와 지식이 모두 들어 있으니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내 곁에 올 생각말아라!"
선생은 讀書많큼 즐겁고 중요한 일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책 속에 인생사 모든 섭리가 있고, 책 속에 자연의 천라만상의 이치가 들어 있으니,
책 읽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遊山과 讀書를 동격으로, 讀書많큼 즐겁고 의미있는 인생사가 "遊山"이었던게죠
퇴계선생님의 등산에 관한 유명한 명언이 있죠?
"讀書는 유산(遊山)이다"
퇴계선생님은 산을 오른다는 표현인 '登山'이라 하지 않고 "유산(遊山)"이라 하였습니다.
즉, 登山은 산을 오른다는 의미 밖에 없지요?
힘들게 산을 오르는것만이 아니라 산을 오르면 내려 가기도 해야하고,
또한 산행 도중 식사도 하고 계곡에 발도 담그며 경치를 즐겁게 즐기며 산행도 해야겠죠?
퇴계선생님은 이미 산행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고
登山이라 하지 않고 유산(遊山)이라 했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앞으로 登山이라 하지 마시고 遊山이라고 하실거죠?
讀書에 대해선 더 설명할 필요 없겠지요?
"책 속에 삶의 지혜와 지식이 모두 들어 있으니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내 곁에 올 생각말아라!"
선생은 讀書많큼 즐겁고 중요한 일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책 속에 인생사 모든 섭리가 있고, 책 속에 자연의 천라만상의 이치가 들어 있으니,
책 읽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遊山과 讀書를 동격으로, 讀書많큼 즐겁고 의미있는 인생사가 "遊山"이었던게죠
  [계단]
"讀書는 유산(遊山)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글의
오리지날 원문을 직접 올려드리겠습니다
讀書如遊山
讀書人說遊山似 사람들은 글읽기가 산을 유람하는 것과 같다더니
今見遊山似讀書 이제 보니 산을 유람하는 것이 책 읽는 것과 같구나
工力盡時元自下 공력을 다하면 스스로 내려오는 법
淺深得處摠由渠 얕고 깊음을 아는 것 모두가 자기에게 달려있네
坐看雲起因知妙 조용히 앉아 일어나는 구름을 보고 오묘함을 알고
行到源頭始覺初 발길이 근원에 이르러 비로소 시초를 깨닫네
- 퇴계 이황 선생님이 쓰신 "讀書如遊山"에서
[계단]
"讀書는 유산(遊山)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글의
오리지날 원문을 직접 올려드리겠습니다
讀書如遊山
讀書人說遊山似 사람들은 글읽기가 산을 유람하는 것과 같다더니
今見遊山似讀書 이제 보니 산을 유람하는 것이 책 읽는 것과 같구나
工力盡時元自下 공력을 다하면 스스로 내려오는 법
淺深得處摠由渠 얕고 깊음을 아는 것 모두가 자기에게 달려있네
坐看雲起因知妙 조용히 앉아 일어나는 구름을 보고 오묘함을 알고
行到源頭始覺初 발길이 근원에 이르러 비로소 시초를 깨닫네
- 퇴계 이황 선생님이 쓰신 "讀書如遊山"에서
 [계단]
사계절이 뚜렸한 우리나라는 계절따라 금수강산이 화려한 변모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산이던 산으로 아주 자주 "遊山" 떠나지 않을래요?
퇴계선생님은 어려서부터 허약하였지만 遊山으로 칠순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장수이지요
확실히 뭘 아시는 분들은 遊山을 한다니까요~
퇴계선생의 遊山계보는 미수 허목선생, 번암 채재공선생, 다산 정약용선생등으로 이어집니다
모두 산을 좋아하셔서 산행기를 많이 남기신 분들입니다
[계단]
사계절이 뚜렸한 우리나라는 계절따라 금수강산이 화려한 변모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산이던 산으로 아주 자주 "遊山" 떠나지 않을래요?
퇴계선생님은 어려서부터 허약하였지만 遊山으로 칠순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장수이지요
확실히 뭘 아시는 분들은 遊山을 한다니까요~
퇴계선생의 遊山계보는 미수 허목선생, 번암 채재공선생, 다산 정약용선생등으로 이어집니다
모두 산을 좋아하셔서 산행기를 많이 남기신 분들입니다
  [계단 쉼터]
단양 丹陽은 鍊丹調陽에서 온 말로서 '연단鍊丹'은 神仙이 먹는 환약을 뜻하고,
'조양調陽'은 빛이 골고루 따뜻하게 비춘다는 의미로 神仙이 다스리는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뜻이랍니다
우리나라 각 고을이 어느 한곳 나름대로 특징없는 곳이 어디있겠습니까만,
단양 丹陽은 특히 충주호로 수몰되어 사라진 고을이며, 현재의 고을은 새로이 계획적으로 이전하여
만들어진 고을이라 어쩌면 新都市라고 해야 할듯합니다
[계단 쉼터]
단양 丹陽은 鍊丹調陽에서 온 말로서 '연단鍊丹'은 神仙이 먹는 환약을 뜻하고,
'조양調陽'은 빛이 골고루 따뜻하게 비춘다는 의미로 神仙이 다스리는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뜻이랍니다
우리나라 각 고을이 어느 한곳 나름대로 특징없는 곳이 어디있겠습니까만,
단양 丹陽은 특히 충주호로 수몰되어 사라진 고을이며, 현재의 고을은 새로이 계획적으로 이전하여
만들어진 고을이라 어쩌면 新都市라고 해야 할듯합니다
 [계단]
'어의곡리'에서 오르는 코스엔 계단이 의외로 많고 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계단만 오르면 거의 정상부에 가까이 가는 것이니
힘든 구간은 계단 오르는 일이라 할수도 있겠습니다
[계단]
'어의곡리'에서 오르는 코스엔 계단이 의외로 많고 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계단만 오르면 거의 정상부에 가까이 가는 것이니
힘든 구간은 계단 오르는 일이라 할수도 있겠습니다
 [소백산 능선]
'등산'이 아니고 '계단 오르기'를 하고나면 바로 소백산 능선이 펼쳐집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 않됩니다. 여기서도 엄청 가야합니다.
여기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식사시간 포함해서 앞으로도 1시간 정도 더 갑니다
[소백산 능선]
'등산'이 아니고 '계단 오르기'를 하고나면 바로 소백산 능선이 펼쳐집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 않됩니다. 여기서도 엄청 가야합니다.
여기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식사시간 포함해서 앞으로도 1시간 정도 더 갑니다
  [소백산 능선]
소백산 비로봉으로 가는 능선은 완만한 경사로 심하게 헐떡거리지는 않습니다
구경거리 없는 지루한 산길을 따라 갑니다
[소백산 능선]
소백산 비로봉으로 가는 능선은 완만한 경사로 심하게 헐떡거리지는 않습니다
구경거리 없는 지루한 산길을 따라 갑니다
 [국망봉 國亡峯]
지루한 능선길을 벗어나 시야가 트일쯤에 웅장한 산줄기가 장엄하게 다가 옵니다
바로 "白頭大幹"입니다.
여암 신경준선생이 만든 "산경표"에 우리나라 골간을 이루는 핵심이 "白頭大幹"이라고
새로운 圖式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요즘 국토지리원에서 펴낸 지도에는 "太白山脈"과 "小白山脈"으로 표기되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왼쪽 봉우리가 "국망봉 國亡峯"입니다.
[국망봉 國亡峯]
지루한 능선길을 벗어나 시야가 트일쯤에 웅장한 산줄기가 장엄하게 다가 옵니다
바로 "白頭大幹"입니다.
여암 신경준선생이 만든 "산경표"에 우리나라 골간을 이루는 핵심이 "白頭大幹"이라고
새로운 圖式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요즘 국토지리원에서 펴낸 지도에는 "太白山脈"과 "小白山脈"으로 표기되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왼쪽 봉우리가 "국망봉 國亡峯"입니다.
 [소백산 정상부 이정표]
소백산은 한반도의 중심에 우뚝솟아 백두대간의 장대함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민족의 명산입니다
형제봉을 시작으로 신선봉, 국망봉, 비로봉, 연화봉 등 명봉들이 웅장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에서는 1970년 속리산, 1984년 월악산에 이어 1987년 세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입니다.
소백산의 사계는 봄에는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의 야생화,
만산홍엽의 가을단풍과 백색 설화가 만개한 정상 풍경은 겨울 산행의 극치를 이루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1,439m 비로봉 정상의 넓은 초지가 사시사철 장관을 이루어 한국의 알프스를 연상케 하며
1,349m 연화봉에 자리한 국립천문대는 우리나라 천문공학의 요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5월말에서 6월 초면
소백산과 단양군 일원에서 전국적인 축제인 철쭉향기 그윽한 "소백산 철쭉제"가 성대히 개최되고 있습니다
[소백산 정상부 이정표]
소백산은 한반도의 중심에 우뚝솟아 백두대간의 장대함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민족의 명산입니다
형제봉을 시작으로 신선봉, 국망봉, 비로봉, 연화봉 등 명봉들이 웅장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에서는 1970년 속리산, 1984년 월악산에 이어 1987년 세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입니다.
소백산의 사계는 봄에는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의 야생화,
만산홍엽의 가을단풍과 백색 설화가 만개한 정상 풍경은 겨울 산행의 극치를 이루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1,439m 비로봉 정상의 넓은 초지가 사시사철 장관을 이루어 한국의 알프스를 연상케 하며
1,349m 연화봉에 자리한 국립천문대는 우리나라 천문공학의 요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5월말에서 6월 초면
소백산과 단양군 일원에서 전국적인 축제인 철쭉향기 그윽한 "소백산 철쭉제"가 성대히 개최되고 있습니다
 [소백산 정상부로 오르는 길]
이름만 듣고 "소백산"을 찾는 산객들이 타고온 관광버스가 죽령 옛길을 가득 메우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백산" 산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으로 늙은 肉山이어서 생동감이 없이 펑퍼짐한 山勢가
夕陽 속으로 떠나가는 나그네같은 느낌을 주어 왠지 쓸쓸해 보여서입니다.
[소백산 정상부로 오르는 길]
이름만 듣고 "소백산"을 찾는 산객들이 타고온 관광버스가 죽령 옛길을 가득 메우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백산" 산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으로 늙은 肉山이어서 생동감이 없이 펑퍼짐한 山勢가
夕陽 속으로 떠나가는 나그네같은 느낌을 주어 왠지 쓸쓸해 보여서입니다.
 [소백산 정상부]
소백산 비로봉 근처 정상부에 올랐습니다.
광활한 평전이 펼쳐집니다. 오로지 평전만.....
[소백산 정상부]
소백산 비로봉 근처 정상부에 올랐습니다.
광활한 평전이 펼쳐집니다. 오로지 평전만.....
  [소백산 정상으로 가는 길]
우리 민족의 靈山은 白頭山입니다.
글자 그대로 머리가 하얀 산이라는 뜻인데 산정상부에는 나무가 없어 대머리같은 산이라는거죠?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白頭大幹은 太白山을 지나 이곳 小白山으로 옵니다
그리고 흘러 흘러 智異山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혜가 남다르게 뛰어나다'고 智異山이라 했는데, 智異山을 얼마 전까지 頭流山이라고 했지요
白'頭'가 흘러 와 생긴 산이라고 '頭'流山이라고 한것입니다
곧 白頭大幹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백산 정상으로 가는 길]
우리 민족의 靈山은 白頭山입니다.
글자 그대로 머리가 하얀 산이라는 뜻인데 산정상부에는 나무가 없어 대머리같은 산이라는거죠?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白頭大幹은 太白山을 지나 이곳 小白山으로 옵니다
그리고 흘러 흘러 智異山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혜가 남다르게 뛰어나다'고 智異山이라 했는데, 智異山을 얼마 전까지 頭流山이라고 했지요
白'頭'가 흘러 와 생긴 산이라고 '頭'流山이라고 한것입니다
곧 白頭大幹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백산 정상으로 가는 길]
백두산이 머리가 허옇다고 白頭山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쓴 이유는
小白山의 산마루가 나무 한포기 찾아 보기 힘든 민둥산이된 믿거나 말거나하는 전설이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白頭山-太白山-小白山-頭流山(智異山)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小白山" 정상부는 왜 민둥산일까?
[소백산 정상으로 가는 길]
백두산이 머리가 허옇다고 白頭山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쓴 이유는
小白山의 산마루가 나무 한포기 찾아 보기 힘든 민둥산이된 믿거나 말거나하는 전설이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白頭山-太白山-小白山-頭流山(智異山)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小白山" 정상부는 왜 민둥산일까?
 [소백산 산봉우리들]
천년 사직을 말아 먹고, 금은보화를 실은 우마차가 십리를 이루며,竹嶺을 넘어,
王建이 새로 세운 高麗의 首都 개성으로 항복하러 가는 新羅의 마지막 王 - 경순왕
현명한 王인지, 비굴한 王인지, 王建의 딸 낙랑공주를 마눌로 얻고 新羅를 넘겨 주지요
[소백산 산봉우리들]
천년 사직을 말아 먹고, 금은보화를 실은 우마차가 십리를 이루며,竹嶺을 넘어,
王建이 새로 세운 高麗의 首都 개성으로 항복하러 가는 新羅의 마지막 王 - 경순왕
현명한 王인지, 비굴한 王인지, 王建의 딸 낙랑공주를 마눌로 얻고 新羅를 넘겨 주지요
 [국망봉과 백두대간]
앞에 보이는 국망봉은 한자로 國亡峯이라고 씁니다
新羅의 마지막 王 - 경순왕이 현명하던 비굴하던 王建이 새로 세운 高麗에 항복을 합니다.
얻은 것은 목숨을 부지하고, 王建의 딸 낙랑공주를 마눌로 얻은 것이지요
경순왕으로부터 세자 책봉을 받은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는 高麗에 항복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왕건의 고려로부터 회복하려다 실패하자,
엄동설한에 베옷 한벌만 걸치고 亡國의 恨을 달래며 금강산으로 들어 들어갔습니다.
거지가 되어 삼베 옷을 걸쳤을 수도 있겠지만, 고려 군사들에게 체포될까봐 변장하기 위해
麻依를 입었다고 보는게 더 합당하겠습니다.
이 세자의 이름은 옛 프로레스링 선수 김일선수와 같은 "金一"이며,
"마의태자"는 '삼베옷을 입은 태자'라고 붙여진 닉네임이지요. 麻依太子
그후 마의태자는 이곳 小白山 국망봉에 올라서
갈수없는 멀리 옛 신라의 도읍 서라벌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산봉우리의 이름이 國亡峯이 되었다는데
麻依太子가 너무나도 슬피울어 뜨거운 눈물에 나무가 다 말라 죽어서
국망봉을 비롯한 소백산에는 나무가 자라지 아니하고
억새와 에델바이스등 목초만이 무성할 뿐이라고 옛부터 슬픈 내력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국망봉과 백두대간]
앞에 보이는 국망봉은 한자로 國亡峯이라고 씁니다
新羅의 마지막 王 - 경순왕이 현명하던 비굴하던 王建이 새로 세운 高麗에 항복을 합니다.
얻은 것은 목숨을 부지하고, 王建의 딸 낙랑공주를 마눌로 얻은 것이지요
경순왕으로부터 세자 책봉을 받은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는 高麗에 항복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왕건의 고려로부터 회복하려다 실패하자,
엄동설한에 베옷 한벌만 걸치고 亡國의 恨을 달래며 금강산으로 들어 들어갔습니다.
거지가 되어 삼베 옷을 걸쳤을 수도 있겠지만, 고려 군사들에게 체포될까봐 변장하기 위해
麻依를 입었다고 보는게 더 합당하겠습니다.
이 세자의 이름은 옛 프로레스링 선수 김일선수와 같은 "金一"이며,
"마의태자"는 '삼베옷을 입은 태자'라고 붙여진 닉네임이지요. 麻依太子
그후 마의태자는 이곳 小白山 국망봉에 올라서
갈수없는 멀리 옛 신라의 도읍 서라벌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산봉우리의 이름이 國亡峯이 되었다는데
麻依太子가 너무나도 슬피울어 뜨거운 눈물에 나무가 다 말라 죽어서
국망봉을 비롯한 소백산에는 나무가 자라지 아니하고
억새와 에델바이스등 목초만이 무성할 뿐이라고 옛부터 슬픈 내력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소백산 정상 - 비로봉]
白頭山이 머리가 벗겨져 붙여졌다면 小白山도 白頭山의 아우이거나 새끼인가 봅니다.
정상부에는 나무 찾아 보기 힘든 광활한 평전이 펼쳐지는데 보는 사람들에 따라
느껴지는 감상은 다르겠습니다.
저는 麻依太子의 전설 때문이 아니라도 왠지 아름답다기 보다는 황량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小白山을 夕陽 속으로 떠나는 나그네 같은 느낌이 든다고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소백산 정상 - 비로봉]
白頭山이 머리가 벗겨져 붙여졌다면 小白山도 白頭山의 아우이거나 새끼인가 봅니다.
정상부에는 나무 찾아 보기 힘든 광활한 평전이 펼쳐지는데 보는 사람들에 따라
느껴지는 감상은 다르겠습니다.
저는 麻依太子의 전설 때문이 아니라도 왠지 아름답다기 보다는 황량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小白山을 夕陽 속으로 떠나는 나그네 같은 느낌이 든다고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비로봉]
소백산 '비로봉' 정상에 왔습니다.
정말 구경거리 없는 산행길이었습니다
이 봉우리만 넘으면 바로 내려 가야합니다.
하지만 저의 산행기가 아직 소백산을 찾아 보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고 싶으세요? ㅎㅎ
[비로봉]
소백산 '비로봉' 정상에 왔습니다.
정말 구경거리 없는 산행길이었습니다
이 봉우리만 넘으면 바로 내려 가야합니다.
하지만 저의 산행기가 아직 소백산을 찾아 보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고 싶으세요? ㅎㅎ
 [비로봉 정상]
비로봉 정상에는 제법 넓은 공터가 있고, 공터 밖으로는 나가지 말라고 울타리를 쳐 놨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돌무덤과 정상석이 서있습니다.
小白山의 여러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온 것입니다
[비로봉 정상]
비로봉 정상에는 제법 넓은 공터가 있고, 공터 밖으로는 나가지 말라고 울타리를 쳐 놨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돌무덤과 정상석이 서있습니다.
小白山의 여러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온 것입니다
 [비로봉 정상석]
비로봉은 한자로 毘盧峯이라고 씁니다
옥편을 찾아 보면 毘 도울 비,盧 성 로(노)/목로 로(노), 峯 봉우리 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毘盧峯'을 한문의 뜻을 찾아 접근하려고하면 무슨 말인지 알수없습니다
왜냐하면 毘盧는 제가 저의 산행기에서 자주 언급하는 "뜻글자"가 아니라 "소리글자"인데
외국어를 한자로 音譯한것이기 때문입니다.
毘盧는 비로자나 毘盧蔗那를 줄인 말인데
인도의 옛글자인 '산스크리트語'로서 Vairocana를 中國語로 音譯한 것입니다.
毘盧蔗那의 중국 발음으로는 Vairocana에 가까운데, 우리나라에선 단순히 中國語로 音譯한 毘盧蔗那를
우리말로 그대로 音譯하여 '비로자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자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語' Vairocana의 뜻을 알면 됩니다
Vairocana는 "태양"이라는 뜻이며, 佛經에서는 '두루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입니다.
불교 종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불교에서 최고의 부처로 "비로자나佛"을 꼽습니다.
'아미타佛' '관세음佛' '약사여래佛'등과 함께 종파에 따라 최고로 모시는 부처라는 말입니다.
毘盧峯은 이런 배경을 가진 최고의 봉우리라는 의미로 붙여진듯합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의 최고봉도 毘盧峯입니다. 소백산의 비로봉과 같은 한자입니다.
참고로 치악산의 "비로봉"은 한자가 "飛盧峯"입니다.
[비로봉 정상석]
비로봉은 한자로 毘盧峯이라고 씁니다
옥편을 찾아 보면 毘 도울 비,盧 성 로(노)/목로 로(노), 峯 봉우리 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毘盧峯'을 한문의 뜻을 찾아 접근하려고하면 무슨 말인지 알수없습니다
왜냐하면 毘盧는 제가 저의 산행기에서 자주 언급하는 "뜻글자"가 아니라 "소리글자"인데
외국어를 한자로 音譯한것이기 때문입니다.
毘盧는 비로자나 毘盧蔗那를 줄인 말인데
인도의 옛글자인 '산스크리트語'로서 Vairocana를 中國語로 音譯한 것입니다.
毘盧蔗那의 중국 발음으로는 Vairocana에 가까운데, 우리나라에선 단순히 中國語로 音譯한 毘盧蔗那를
우리말로 그대로 音譯하여 '비로자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자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語' Vairocana의 뜻을 알면 됩니다
Vairocana는 "태양"이라는 뜻이며, 佛經에서는 '두루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입니다.
불교 종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불교에서 최고의 부처로 "비로자나佛"을 꼽습니다.
'아미타佛' '관세음佛' '약사여래佛'등과 함께 종파에 따라 최고로 모시는 부처라는 말입니다.
毘盧峯은 이런 배경을 가진 최고의 봉우리라는 의미로 붙여진듯합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의 최고봉도 毘盧峯입니다. 소백산의 비로봉과 같은 한자입니다.
참고로 치악산의 "비로봉"은 한자가 "飛盧峯"입니다.
 [비로봉 정상석과 이정표]
"毘盧峯" 정상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어서 정상석이 두개있습니다
충북과 경북에서 각각 세워놨으니 한 걸음으로 兩道를 왕복 할수 있습니다
[비로봉 정상석과 이정표]
"毘盧峯" 정상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어서 정상석이 두개있습니다
충북과 경북에서 각각 세워놨으니 한 걸음으로 兩道를 왕복 할수 있습니다
 [비로봉 정상에서 바라 보는 "국망봉"]
麻依太子가 너무나도 슬피울어 뜨거운 눈물에 나무가 다 말라 죽어
저렇게 황량한 모습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 "國亡峯" 넘어 "고치령"이 있는데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산객들이 그곳에서
竹嶺까지 區間으로 끊어 종주를 하루에 하지요.
"고치령"은 "단종복위운동"을 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금성대군"의 밀사들이
오르내린 숨은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합니다. 이 복위운동이 수양대군에게 발각되어
금성대군 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의 백성들까지 초죽음을 당해 영주가 피바다를 이루었답니다.
또한 "고치령"은 "태백산"과 "소백산"을 분리시켜 경계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지요.
[비로봉 정상에서 바라 보는 "국망봉"]
麻依太子가 너무나도 슬피울어 뜨거운 눈물에 나무가 다 말라 죽어
저렇게 황량한 모습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 "國亡峯" 넘어 "고치령"이 있는데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산객들이 그곳에서
竹嶺까지 區間으로 끊어 종주를 하루에 하지요.
"고치령"은 "단종복위운동"을 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금성대군"의 밀사들이
오르내린 숨은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합니다. 이 복위운동이 수양대군에게 발각되어
금성대군 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의 백성들까지 초죽음을 당해 영주가 피바다를 이루었답니다.
또한 "고치령"은 "태백산"과 "소백산"을 분리시켜 경계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지요.
 [비로봉 정상에서 바라 보는 백두대간 "연화봉"]
白頭大幹이 장엄하게 뻗어있습니다.
제1연화봉, 연화봉, 제2연화봉(천문대)이 순서대로 누워있습니다.
저 산줄기를 따라 가면 竹嶺이 나옵니다.
[비로봉 정상에서 바라 보는 백두대간 "연화봉"]
白頭大幹이 장엄하게 뻗어있습니다.
제1연화봉, 연화봉, 제2연화봉(천문대)이 순서대로 누워있습니다.
저 산줄기를 따라 가면 竹嶺이 나옵니다.
 [비로봉 정상에서 바라 보는 백두대간 "죽령"방향]
소백산 죽령에 얽힌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퇴계 이황선생님과 쌍벽을 이룬 성리학의 대가 "주세붕선생"이
형조참판을 거쳐 호조참판으로 73세 되는 해에 드디어 병을 핑계로 은퇴 낙향하는 "이현보선생"과
죽령에서 조우하며 읊은 詩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보선생이 먼저 환영 나온 주세붕선생에게 한수 날립니다
草草行裝白首郞(초초행장백수랑)
秋風匹馬嶺途長(추풍필마령도장)
莫言林下稀相見(막언림하희상견)
落葉歸根自是裳(낙엽귀근자족상)
초라한 행장에 흰 머리카락 휘날리는 사내가
가을바람 부는데 한 필의 말로 멀리 고개를 넘어
수풀 아래에서 서로가 드물게 만난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
우리 인간들이 낙엽과 뿌리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늘 그러한 것이니라.
-이현보-
주세붕선생이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飄飄歸興 ?漁郞(표표귀흥진어랑)
直沂驪江玉帶長(직기려강옥대장)
今日竹領回首意(금일죽령회수의)
乾坤萬古是綱常(건곤만고시강상)
깃발을 나부끼면서 흥겨운 마음으로 돌아온 사내는
여강을 거슬러 긴 옥대를 찬 채 줏대 있게 똑바로 온 것이오.
오늘날 죽령으로 머리를 되돌린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옛날과 고금에서 늘 이렇게 변함없는 진리일 뿐이오.
-주세붕-
[비로봉 정상에서 바라 보는 백두대간 "죽령"방향]
소백산 죽령에 얽힌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퇴계 이황선생님과 쌍벽을 이룬 성리학의 대가 "주세붕선생"이
형조참판을 거쳐 호조참판으로 73세 되는 해에 드디어 병을 핑계로 은퇴 낙향하는 "이현보선생"과
죽령에서 조우하며 읊은 詩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보선생이 먼저 환영 나온 주세붕선생에게 한수 날립니다
草草行裝白首郞(초초행장백수랑)
秋風匹馬嶺途長(추풍필마령도장)
莫言林下稀相見(막언림하희상견)
落葉歸根自是裳(낙엽귀근자족상)
초라한 행장에 흰 머리카락 휘날리는 사내가
가을바람 부는데 한 필의 말로 멀리 고개를 넘어
수풀 아래에서 서로가 드물게 만난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
우리 인간들이 낙엽과 뿌리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늘 그러한 것이니라.
-이현보-
주세붕선생이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飄飄歸興 ?漁郞(표표귀흥진어랑)
直沂驪江玉帶長(직기려강옥대장)
今日竹領回首意(금일죽령회수의)
乾坤萬古是綱常(건곤만고시강상)
깃발을 나부끼면서 흥겨운 마음으로 돌아온 사내는
여강을 거슬러 긴 옥대를 찬 채 줏대 있게 똑바로 온 것이오.
오늘날 죽령으로 머리를 되돌린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옛날과 고금에서 늘 이렇게 변함없는 진리일 뿐이오.
-주세붕-
 [비로봉 정상에서 바라 보는 지나온 "어의곡 등산로"]
지나온 '어의곡' 등산로가 서부영화 "O.K목장의 결투"의 O.K목장 같습니다
[비로봉 정상에서 바라 보는 지나온 "어의곡 등산로"]
지나온 '어의곡' 등산로가 서부영화 "O.K목장의 결투"의 O.K목장 같습니다
 [비로봉 정상에서 바라 보는 "영주시 순흥면"]
이제 내려 가야할 영주시 순흥면 삼가리가 펼쳐집니다.
뭉게 구름이 피어 오르는 광경이 여름 날씨 같습니다
오르면 또 내려 가는것. 이제부터 하산합니다.
[비로봉 정상에서 바라 보는 "영주시 순흥면"]
이제 내려 가야할 영주시 순흥면 삼가리가 펼쳐집니다.
뭉게 구름이 피어 오르는 광경이 여름 날씨 같습니다
오르면 또 내려 가는것. 이제부터 하산합니다.
 [비로봉 정상에서 바라 보는 하산길과 영주시 순흥면]
경북 영양 출신인 청록파 시인 "조지훈"선생은 처가가 이곳 영주여서 이곳에서
쓴 시가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詩입니다.
別離
조지훈
푸른 기와 이끼 낀 지붕 너머로
나즉히 흰구름은 피었다 지고
두리기둥 난간에 반만 숨은 색시의
초록 저고리 당홍치마 자락에
말 없는 슬픔이 쌓여 오느니――
십리라 푸른 강물은 휘돌아가는데
밟고 간 자취는 바람이 밀어 가고
방울 소리만 아련히
끊질 듯 끊질 듯 고운 뫼아리
발 돋우고 눈 들어 아득한 연봉(連峰)을 바라보나
이미 어진 선비의 그림자는 없어……
자주 고름에 소리 없이 맺히는 이슬 방울
이제 임이 가시고 가을이 오면
원앙침(鴛鴦枕) 비인 자리를 무엇으로 가리울꼬
꾀꼬리 노래하던 실버들 가지
꺾어서 채찍 삼고 가옵신 님아……
조지훈선생은 "향수"라는 詩를 쓴 "정지용선생님"이 등단시켰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구요? ㅎㅎ
"정지용선생님"이 저의 휘문고등학교 출신 선배이기도 하며, 또한 영어교사로도 재직하셔서
쪼끔 자랑겸 ...ㅎㅎ
4자 기수 선배님들은 '정지용선생님'에게서 수업 받던 시절을 잘 기억하시고 계셨는데
무척 엄하셨다고 하더군요.
[비로봉 정상에서 바라 보는 하산길과 영주시 순흥면]
경북 영양 출신인 청록파 시인 "조지훈"선생은 처가가 이곳 영주여서 이곳에서
쓴 시가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詩입니다.
別離
조지훈
푸른 기와 이끼 낀 지붕 너머로
나즉히 흰구름은 피었다 지고
두리기둥 난간에 반만 숨은 색시의
초록 저고리 당홍치마 자락에
말 없는 슬픔이 쌓여 오느니――
십리라 푸른 강물은 휘돌아가는데
밟고 간 자취는 바람이 밀어 가고
방울 소리만 아련히
끊질 듯 끊질 듯 고운 뫼아리
발 돋우고 눈 들어 아득한 연봉(連峰)을 바라보나
이미 어진 선비의 그림자는 없어……
자주 고름에 소리 없이 맺히는 이슬 방울
이제 임이 가시고 가을이 오면
원앙침(鴛鴦枕) 비인 자리를 무엇으로 가리울꼬
꾀꼬리 노래하던 실버들 가지
꺾어서 채찍 삼고 가옵신 님아……
조지훈선생은 "향수"라는 詩를 쓴 "정지용선생님"이 등단시켰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구요? ㅎㅎ
"정지용선생님"이 저의 휘문고등학교 출신 선배이기도 하며, 또한 영어교사로도 재직하셔서
쪼끔 자랑겸 ...ㅎㅎ
4자 기수 선배님들은 '정지용선생님'에게서 수업 받던 시절을 잘 기억하시고 계셨는데
무척 엄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산하며 뒤 돌아 본 "비로봉"]
구경거리는 없고....
국립공원 소백산엔 인공시설물만이 정상을 쳐받히고있고....
그래서 "퇴계선생을 사랑한 여인 - 杜香"에 대해 얘기하며 산행기를 마치렵니다.
퇴계선생은 우리에게 근엄하고 학식이 풍부한 관료로 각인되 왔습니다.
그래서 퇴계선생의 "러브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퇴계선생을 퇴계선생이 죽을 때까지 사랑한 여인 - "두향"
죽을 때까지 "두향"을 그리워했던 퇴계 이황선생
로미오와 주리엣의 러브 스토리보다 더 찐한 감동을 주는 "두향 아씨"와 "퇴계선생"의
러브 스토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로서 정비석선생이 쓴 "名妓列傳" "杜香편"에 나와있는 글을 요약하고
나름대로 쬐끔 해석을 덧붙여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머니 속에 들어 오면 우리를 행복하게하고, 나가면 슬프게 하는게 있지요.
바로 "돈"입니다. 요즘 새로나온 만원짜리에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지만,
舊券에는 퇴계 이황선생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그 둘레에 스무 송이의 매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매화를 관심있게 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만지고 본 그 "돈"에 매화가 그려진 사연이......."두향 아씨"와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동안 "두향아씨"를 수없이 이미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산하며 뒤 돌아 본 "비로봉"]
구경거리는 없고....
국립공원 소백산엔 인공시설물만이 정상을 쳐받히고있고....
그래서 "퇴계선생을 사랑한 여인 - 杜香"에 대해 얘기하며 산행기를 마치렵니다.
퇴계선생은 우리에게 근엄하고 학식이 풍부한 관료로 각인되 왔습니다.
그래서 퇴계선생의 "러브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퇴계선생을 퇴계선생이 죽을 때까지 사랑한 여인 - "두향"
죽을 때까지 "두향"을 그리워했던 퇴계 이황선생
로미오와 주리엣의 러브 스토리보다 더 찐한 감동을 주는 "두향 아씨"와 "퇴계선생"의
러브 스토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로서 정비석선생이 쓴 "名妓列傳" "杜香편"에 나와있는 글을 요약하고
나름대로 쬐끔 해석을 덧붙여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머니 속에 들어 오면 우리를 행복하게하고, 나가면 슬프게 하는게 있지요.
바로 "돈"입니다. 요즘 새로나온 만원짜리에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지만,
舊券에는 퇴계 이황선생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그 둘레에 스무 송이의 매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매화를 관심있게 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만지고 본 그 "돈"에 매화가 그려진 사연이......."두향 아씨"와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동안 "두향아씨"를 수없이 이미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산길]
조선조 중종 년 간에 단양에는 이름난 기생 '두향'이 있었답니다.
다섯 살 되면서 그 아비를 잃고, 열 살 되던 해에 그 어미마저 사별하자
그녀의 빼어난 자태를 아까워한 한 퇴기(退妓)에 의하여 길러지면서 기적에 오르게 됩니다.
몸매도 아름다웠거니와 거문고에 능하였으며 시문에도 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특히 난(蘭)과 분매(盆梅-화분에 매화를 기름) 솜씨가 있었다고합니다
두향의 어미는 죽기 전에 화분 속에 매화 한 그루를 잘 길러 냈는데,
매년마다 그 분매에서 꽃이 피고 있었답니다.
두향은 그 어미가 죽자 기적에 오를 때까지 고이 잘 길러 냈다고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매화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고하네요.
전신응시명월(前身應是明月)
기생수도매화(幾生修到梅花)
내 전생은 밝은 달이었지
몇 생이나 닦아야 매화가 될까
[하산길]
조선조 중종 년 간에 단양에는 이름난 기생 '두향'이 있었답니다.
다섯 살 되면서 그 아비를 잃고, 열 살 되던 해에 그 어미마저 사별하자
그녀의 빼어난 자태를 아까워한 한 퇴기(退妓)에 의하여 길러지면서 기적에 오르게 됩니다.
몸매도 아름다웠거니와 거문고에 능하였으며 시문에도 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특히 난(蘭)과 분매(盆梅-화분에 매화를 기름) 솜씨가 있었다고합니다
두향의 어미는 죽기 전에 화분 속에 매화 한 그루를 잘 길러 냈는데,
매년마다 그 분매에서 꽃이 피고 있었답니다.
두향은 그 어미가 죽자 기적에 오를 때까지 고이 잘 길러 냈다고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매화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고하네요.
전신응시명월(前身應是明月)
기생수도매화(幾生修到梅花)
내 전생은 밝은 달이었지
몇 생이나 닦아야 매화가 될까
 [하산길]
운명이 운명 다울려면 모티베이션이 있어야지요
때마침 듣자하니 단양의 제 15대 군수로 퇴계 이황선생이 부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때 이미 단양의 官妓가 되 있었던 두향은 퇴계라는 신임 군수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여
수소문하여 보았습니다. 약삭 빠르다고 해야겠죠?
그리곤 퇴계선생이 매화를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퇴계선생이 매화에 대해 쓴 詩는 118편이나 있는데 최초로 매화에 관헤 쓴 詩를 입수하여 음미해 봅니다
一樹庭梅雪滿枝(일수정매설만지) - 뜰앞에 매화나무 가지 가득 눈꽃 피니,
風塵湖海夢差池(풍진호해몽차지) - 풍진의 세상살이 꿈마저 어지럽네.
玉堂坐對春宵月(옥당좌대춘소월) - 옥당에 홀로 앉아 봄밤의 달을 보며,
鴻雁聲中有所思(홍안성중유소사) - 기러기 슬피 울 제 생각마다 산란하네
두향은 이 詩가 퇴계선생이 매화를 두고 읊은 詩이기는 하나
나라의 어지러움을 개탄하는 우국지정이 어린 詩임을 느낌니다.
비록 조정의 벼슬자리에 앉아 있으나, 바다같이 넓은 세상일이 좁은 연못 속에 뒤 엉겨 있는 듯,
어지럽고 산란함을 매화나무에 빗대어 읊은 시를 두고 두고 음미하였습니다
두향은 어느 사이 퇴계선생의 매화 시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산길]
운명이 운명 다울려면 모티베이션이 있어야지요
때마침 듣자하니 단양의 제 15대 군수로 퇴계 이황선생이 부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때 이미 단양의 官妓가 되 있었던 두향은 퇴계라는 신임 군수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여
수소문하여 보았습니다. 약삭 빠르다고 해야겠죠?
그리곤 퇴계선생이 매화를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퇴계선생이 매화에 대해 쓴 詩는 118편이나 있는데 최초로 매화에 관헤 쓴 詩를 입수하여 음미해 봅니다
一樹庭梅雪滿枝(일수정매설만지) - 뜰앞에 매화나무 가지 가득 눈꽃 피니,
風塵湖海夢差池(풍진호해몽차지) - 풍진의 세상살이 꿈마저 어지럽네.
玉堂坐對春宵月(옥당좌대춘소월) - 옥당에 홀로 앉아 봄밤의 달을 보며,
鴻雁聲中有所思(홍안성중유소사) - 기러기 슬피 울 제 생각마다 산란하네
두향은 이 詩가 퇴계선생이 매화를 두고 읊은 詩이기는 하나
나라의 어지러움을 개탄하는 우국지정이 어린 詩임을 느낌니다.
비록 조정의 벼슬자리에 앉아 있으나, 바다같이 넓은 세상일이 좁은 연못 속에 뒤 엉겨 있는 듯,
어지럽고 산란함을 매화나무에 빗대어 읊은 시를 두고 두고 음미하였습니다
두향은 어느 사이 퇴계선생의 매화 시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산하며 뒤 돌아 본 "비로봉"]
퇴계선생은 48세 되던 무신년(1542년) 정월에 단양군수로 부임하게됩니다.
운명적 만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당시 두향은 단양의 官妓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官妓로서 두향은 신임 군수 퇴계 이황을 가까이 모시게 됩니다.
두향은 사별하던 어미로부터 물려받아 그동안 애지중지 기르던 매화를 퇴계의 처소에 옮겨놓았습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두향이가 약삭 빠른 잔머리를 돌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때마침 퇴계가 단양으로 부임하던 시기는 이른봄이라 화분 속의 매화도 곱게 피어
은은한 향기를 내 뿜고 있었습니다.처소에 든 퇴계선생은 환하게 피어난 매화를 보고
반기는 듯 하였으나, 이내 곧 매화 분을 가져온 사람에게 돌려 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두향은 매화분에 관한 자초지종을 아뢰고, 6년전의 퇴계선생이 읊은 매화 시를 외우면서,
매화는 고상하고 아담하여 속기(俗氣)가 없고, 추운 때에 더욱 아름다우며, 호젓한 향기가 뛰어나고,
격조가 높으며, 운치가 남다르며, 뼈대는 말랐지만 정신이 맑고, 찬바람과 눈보라에 시달리면서도,
곧은 마음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이 매화꽃과 함께 심신의 안정을 되찾고,
선생께서 단양 고을을 잘 다스려 줄 것을 아뢰었습니다.
이 정도면 천하의 퇴계선생이라도 홀리지 않을수 없겠지요? 미모까지 갖추었으니....
[하산하며 뒤 돌아 본 "비로봉"]
퇴계선생은 48세 되던 무신년(1542년) 정월에 단양군수로 부임하게됩니다.
운명적 만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당시 두향은 단양의 官妓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官妓로서 두향은 신임 군수 퇴계 이황을 가까이 모시게 됩니다.
두향은 사별하던 어미로부터 물려받아 그동안 애지중지 기르던 매화를 퇴계의 처소에 옮겨놓았습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두향이가 약삭 빠른 잔머리를 돌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때마침 퇴계가 단양으로 부임하던 시기는 이른봄이라 화분 속의 매화도 곱게 피어
은은한 향기를 내 뿜고 있었습니다.처소에 든 퇴계선생은 환하게 피어난 매화를 보고
반기는 듯 하였으나, 이내 곧 매화 분을 가져온 사람에게 돌려 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두향은 매화분에 관한 자초지종을 아뢰고, 6년전의 퇴계선생이 읊은 매화 시를 외우면서,
매화는 고상하고 아담하여 속기(俗氣)가 없고, 추운 때에 더욱 아름다우며, 호젓한 향기가 뛰어나고,
격조가 높으며, 운치가 남다르며, 뼈대는 말랐지만 정신이 맑고, 찬바람과 눈보라에 시달리면서도,
곧은 마음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이 매화꽃과 함께 심신의 안정을 되찾고,
선생께서 단양 고을을 잘 다스려 줄 것을 아뢰었습니다.
이 정도면 천하의 퇴계선생이라도 홀리지 않을수 없겠지요? 미모까지 갖추었으니....
 [하산길]
퇴계가 두향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두향의 속마음이 진실 된 듯 한데,
고을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기위해 왔는데, 스스로가 백성으로부터 재물이나, 금전을 뇌물로
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무 한 그루 처소에 가져온 것을 차마 물리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두향레게 마음이 동해서 그랬는지는 현재로선 알수 없습니다. ㅎㅎ
왜냐하면 이 때에 퇴계선생은 첫 부인과 재취부인마저 사별하고,
아들도 이미 한 명이 유명을 달리한 때라,
인생의 깊은 고뇌와 함께 심신은 많이 쇠약하여 있었기때문입니다.
무척 외로웠던 퇴계선생. 그도 퇴계선생 이전에 男子이었기에..이겻이 중요하지요? ㅎㅎ
ㅎㅎ이 때부터 두 사람은 시화(詩話)와 음률을 논하고,
지금의 단양팔경과 강선대를 거닐며 인생을 즐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산길]
퇴계가 두향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두향의 속마음이 진실 된 듯 한데,
고을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기위해 왔는데, 스스로가 백성으로부터 재물이나, 금전을 뇌물로
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무 한 그루 처소에 가져온 것을 차마 물리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두향레게 마음이 동해서 그랬는지는 현재로선 알수 없습니다. ㅎㅎ
왜냐하면 이 때에 퇴계선생은 첫 부인과 재취부인마저 사별하고,
아들도 이미 한 명이 유명을 달리한 때라,
인생의 깊은 고뇌와 함께 심신은 많이 쇠약하여 있었기때문입니다.
무척 외로웠던 퇴계선생. 그도 퇴계선생 이전에 男子이었기에..이겻이 중요하지요? ㅎㅎ
ㅎㅎ이 때부터 두 사람은 시화(詩話)와 음률을 논하고,
지금의 단양팔경과 강선대를 거닐며 인생을 즐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산길]
하지만 달콤한 사랑 뒤에는 반드시 애달픈 이별이 있는 법이지요
퇴계선생이 단양 군수로 부임한지 10개월만에 단양 땅을 떠나야만 할 일이 생깁니다.
그 해 10월에 퇴계선생의 친형인 '대헌공'이 직속상관인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해 옵니다.
형과 아우가 직속상하관계로 있으면 나라 일에 공평을 기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세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게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퇴계는 그 날로 사표를 제출합니다,
청렴 결백한 그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의 성품을 알아차린 조정에서는 그를 충청도가 아닌 경상도 풍기 군수로 임명하게됩니다.
이렇게 되어 퇴계선생과 두향은 애달픈 이별을 하게 되는거지요. 삼류 소설같다구요? ㅎㅎ
인간지사가 모두 그렇고 그런거 아닙니까?
퇴계선생은 단양을 떠나 풍기 군수로 옮겨가면서 두향으로부터 받은 靑梅 한 그루도 함께 가져가서
고향인 안동의 도산서원에 심었다고 합니다
한편 퇴계선생이 떠난 후 두향은 부유함과 호사스러움을 앞 새우는 시중잡배들과 어울리는 것이
단 10개월 동안이나마 모시던 그 어른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하고
아예 기생에서 물러 날 것을 결심하고 새로 부임한 사또에게 그 사연을 말하고 허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임 사또의 허락을 받아 기생에서 면천되어 물러난 두향은 오로지 퇴계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함께 노닐던 강변을 혼자서 거닐기도 하고, 수많은 사연들을 추억하면서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하산길]
하지만 달콤한 사랑 뒤에는 반드시 애달픈 이별이 있는 법이지요
퇴계선생이 단양 군수로 부임한지 10개월만에 단양 땅을 떠나야만 할 일이 생깁니다.
그 해 10월에 퇴계선생의 친형인 '대헌공'이 직속상관인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해 옵니다.
형과 아우가 직속상하관계로 있으면 나라 일에 공평을 기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세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게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퇴계는 그 날로 사표를 제출합니다,
청렴 결백한 그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의 성품을 알아차린 조정에서는 그를 충청도가 아닌 경상도 풍기 군수로 임명하게됩니다.
이렇게 되어 퇴계선생과 두향은 애달픈 이별을 하게 되는거지요. 삼류 소설같다구요? ㅎㅎ
인간지사가 모두 그렇고 그런거 아닙니까?
퇴계선생은 단양을 떠나 풍기 군수로 옮겨가면서 두향으로부터 받은 靑梅 한 그루도 함께 가져가서
고향인 안동의 도산서원에 심었다고 합니다
한편 퇴계선생이 떠난 후 두향은 부유함과 호사스러움을 앞 새우는 시중잡배들과 어울리는 것이
단 10개월 동안이나마 모시던 그 어른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하고
아예 기생에서 물러 날 것을 결심하고 새로 부임한 사또에게 그 사연을 말하고 허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임 사또의 허락을 받아 기생에서 면천되어 물러난 두향은 오로지 퇴계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함께 노닐던 강변을 혼자서 거닐기도 하고, 수많은 사연들을 추억하면서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하산길]
헤어진지 어언 4년이 되는 어느 봄날에 문안 여쭈러 보낸 인편에
퇴계선생은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두향에게 보내주었습니다.
黃卷中間對聖賢(황군중간대성현) - 누렇게 바랜 옛 책 속에서 성현을 대하며,
虛明一室坐超然(허명일실좌초연) - 비어 있는 방안에 초연히 앉았노라.
梅窓又見春消息(매창우견춘속식) - 매화 핀 창가에서 봄소식을 다시 보니
莫向瑤琴嘆絶絃(막햑요금탄절현) - 거문고 마주 앉아 줄 끊겼다 한탄을 말라
이 시문의 끝 구절에 "거문고 마주 앉아 줄 끊겼다 한탄 마라"는
분명히 두향의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하산길]
헤어진지 어언 4년이 되는 어느 봄날에 문안 여쭈러 보낸 인편에
퇴계선생은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두향에게 보내주었습니다.
黃卷中間對聖賢(황군중간대성현) - 누렇게 바랜 옛 책 속에서 성현을 대하며,
虛明一室坐超然(허명일실좌초연) - 비어 있는 방안에 초연히 앉았노라.
梅窓又見春消息(매창우견춘속식) - 매화 핀 창가에서 봄소식을 다시 보니
莫向瑤琴嘆絶絃(막햑요금탄절현) - 거문고 마주 앉아 줄 끊겼다 한탄을 말라
이 시문의 끝 구절에 "거문고 마주 앉아 줄 끊겼다 한탄 마라"는
분명히 두향의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小白山 毘爐寺]
그 후 20여년이 흘러 갔습니다.
1570년 어느 겨울날 퇴계선생은 방안의 梅花을 가리키며
"매형(梅兄)에게 물 잘 주라"는 말을 남기고 임종하였습니다.
퇴계선생은 죽을 때까지 梅花,, 즉 두향을 그리워하며 잘 챙겨 달라고 부탁하며 갔습니다
두향은 퇴계선생의 부음을 예측하고 사흘을 걸어서 찾아갔지만
신분이 기생이라 드러내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세 번 절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신변을 정리하고 시신은 강선대 아래 묻어달라는 마지막 유언과 함께
거문고 부여잡고 초혼가를 부르면서 부자탕을 마시고 세상을 하직합니다
두향杜香의 묘는 단양팔경 중 백미라 할 수 있는 '구담봉, 옥순봉' 근처 충주호 위에 떠있는
말목산 자락에서 퇴계선생과 노닐던 '강선대'가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현재 그녀의 墓에는 다음과 같은 詩碑가 있는데
조선 숙종때의 월암(月巖) 이광려(李匡呂)의 작품이라합니다
孤墳臨官道(고분임관도) - 외로운 무덤 하나 국도변에 있는데,
頹沙暎紅 (퇴사영홍악) - 거치른 모래 밭엔 꽃도 볽게 피었네.
杜香名盡時(두향명진시) - 두향의 이름이 사라질 때면,
仙臺石應落(선대석응낙) - 강선대 바윗돌도 사라지리라
[小白山 毘爐寺]
그 후 20여년이 흘러 갔습니다.
1570년 어느 겨울날 퇴계선생은 방안의 梅花을 가리키며
"매형(梅兄)에게 물 잘 주라"는 말을 남기고 임종하였습니다.
퇴계선생은 죽을 때까지 梅花,, 즉 두향을 그리워하며 잘 챙겨 달라고 부탁하며 갔습니다
두향은 퇴계선생의 부음을 예측하고 사흘을 걸어서 찾아갔지만
신분이 기생이라 드러내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세 번 절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신변을 정리하고 시신은 강선대 아래 묻어달라는 마지막 유언과 함께
거문고 부여잡고 초혼가를 부르면서 부자탕을 마시고 세상을 하직합니다
두향杜香의 묘는 단양팔경 중 백미라 할 수 있는 '구담봉, 옥순봉' 근처 충주호 위에 떠있는
말목산 자락에서 퇴계선생과 노닐던 '강선대'가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현재 그녀의 墓에는 다음과 같은 詩碑가 있는데
조선 숙종때의 월암(月巖) 이광려(李匡呂)의 작품이라합니다
孤墳臨官道(고분임관도) - 외로운 무덤 하나 국도변에 있는데,
頹沙暎紅 (퇴사영홍악) - 거치른 모래 밭엔 꽃도 볽게 피었네.
杜香名盡時(두향명진시) - 두향의 이름이 사라질 때면,
仙臺石應落(선대석응낙) - 강선대 바윗돌도 사라지리라
  [휴식]
[휴식]

 [뒷풀이]
이번 산행에는 집행부에서 특별히 간편 부폐를 차려 교우들을 즐겁게했습니다
이곳에는 마땅한 음식점이 없어 이렇게 상을 차렸답니다.
[뒷풀이]
이번 산행에는 집행부에서 특별히 간편 부폐를 차려 교우들을 즐겁게했습니다
이곳에는 마땅한 음식점이 없어 이렇게 상을 차렸답니다.
 [뒷풀이]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렇게 해주면 교우들이 더 좋아 할텐데...ㅎㅎ
[뒷풀이]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렇게 해주면 교우들이 더 좋아 할텐데...ㅎㅎ
 經師易遇 경사이우
人師難逢 인사난봉
"글 가르치는 스승은 만나기 쉬워도, 사람 만드는 인격이 높은 어진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
퇴계선생을 생각하며...............소백산 산행을 마침니다
經師易遇 경사이우
人師難逢 인사난봉
"글 가르치는 스승은 만나기 쉬워도, 사람 만드는 인격이 높은 어진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
퇴계선생을 생각하며...............소백산 산행을 마침니다
 [산행개념도]
[산행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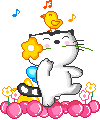
파란문印
|